2022 봄 • 山:門 PEOPLE
인터뷰 | 작곡가 황호준
글박병성
발행일2022.03.31
새로운 극양식의 탄생
서울남산국악당 <발푸르기스-욕망의 기원>의 황호준 작곡가
서사무가극 <발푸르기스-욕망의 기원>(이하 <발푸르기스>)에서 황호준은 작곡 이외에도 극작과 연출을 동시에 맡는다. 이 작품의 장르가 ‘서사무가극’인 것을 보면 무리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이 낯선 장르 명칭은 황호준이 이번 작품에 부여한 것이다. 이전에도 이런 류의 작품이 시도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있다 하더라도 몇 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실험적이면서 의식적인 작업이다. 황호준의 음악 인생을 따라가면 왜 그가 서사무가극 <발푸르기스>에 이르게 되었는지가 선명해진다.
인생의 목표, 음악
황호준이 삶의 목표를 음악에 두게 된 것은 유년 시절의 강렬한 기억 때문이다. 대표적인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창작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는 음악가로서의 꿈을 키웠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김종률이 곡을 쓰고, 백기완의 작품에서 일부를 차용해 소설가 황석영이 가사를 썼고, 그의 2층집에서 녹음되었다. 황호준은 소설가 황석영의 아들이다. 은밀하게 진행되는 이 작업이 어린 황호준에게도 무척 위험한 일이라는 인상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노래가 사람들에 의해 불려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노래의 힘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때의 인상이 황호준의 삶에 강렬한 영향을 끼쳤고 음악을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다. 이 땅에서 나고 자랐으니 자기 음악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국음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광주에서 예고를 다니던 시절 음악에 대한 꿈을 키워야 하는 시기였지만 시대가 그를 음악에 몰두하게 놔두지 않았다. 초등학교 때 광주민주화운동을 직접 경험했던 그는 불의한 세상에 침묵하고만 있는 청년이 아니었다. 1980년대 후반 고등학생 시절 세상은 엄혹했다. 불의에 대항하여 목소리를 내다보니 안기부에 잡혀가게 되고 고등학교를 그만두는 지경에 이른다. 이때는 음악보다도 현실에 대한 관심과 이와 관련된 책을 읽으며 그만의 세상을 넓혀가는 게 더 중요했다.
그렇다고 음악 자체에 대한 욕망이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니었다. 현실이 그 욕망을 잠시 숨죽이게 했을 뿐. 다시 음악에 대한 열망을 본격적으로 가다듬은 것은 20대에 이르러서였다. 공부를 해서 대학에 들어가고 10대에 책임 있게 밟지 못한 음악에 몰입하는 시간을 보냈다. 세상과 긴밀하고 조응하는 문학이나 연극은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도 예술의 한 방편이 될 수 있지만, 음악은 그렇지 않았다. 골방에서 내면 깊은 곳의 추상의 세계와 벼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다.
음악이 추상의 영역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이라면 세상에 뜨겁게 발언했던 그가 어떻게 음악을 지속할 수 있었을까. 세상 속에서 음악의 역할을 찾는 것이 그에게는 중요한 화두였다.
“세상은 다양한 부딪힘 속에서 상처받고 멈춰지고 퇴행하는 과정 속에서 나아가요. 그런 흐름과 같이 하는 프로파간다적인 예술도 있지만, 예술의 궁극적인 역할은 행동의 영역에서 받은 상처를 보듬고, 봉합하고 위로하고, 뒤처진 것들을 어루만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현실 속에서 음악의 역할을 찾은 그는 안정적인 직장 대신 창작에 몰두할 수 있는 자리를 선택했고, 음악가로서 자리를 잡기까지 다양한 숙련 과정을 거쳤지만, 음악에서 벗어난 일을 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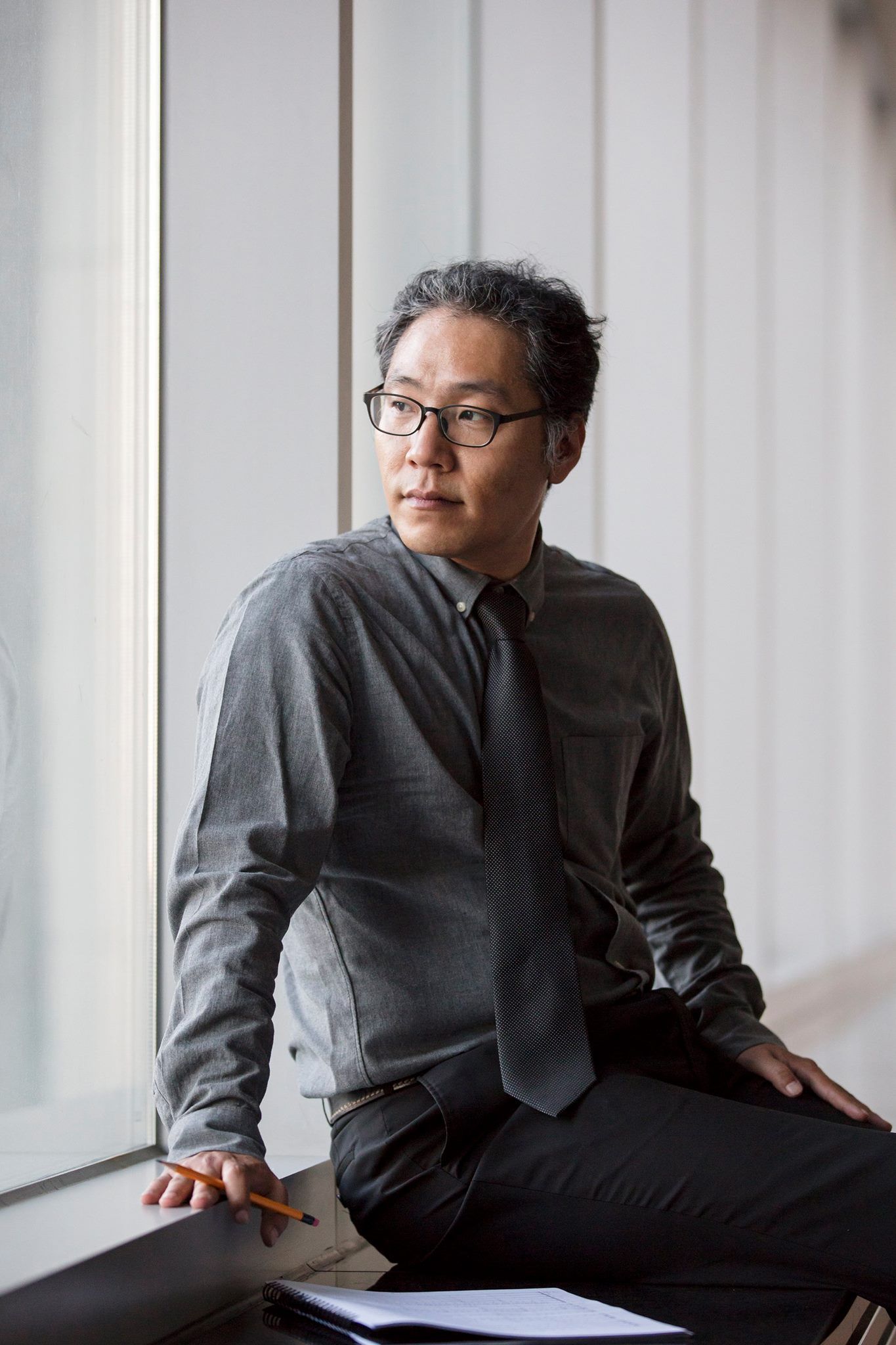
음악극과 만난 시간
꾸준히 음악 작업을 해오는 시간이 쌓이게 되자 작은 인연으로 맺어진 사람들로부터 작곡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전업 작곡가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 중인 2008년 즈음하여 뮤지컬 <왕세자 실종사건>과 국립오페라단의 창작 오페라 <아랑>을 작업할 기회를 얻는다.이전까지는 주로 추상의 영역을 다루는 순수기악곡을 창작하는 작업을 하였다면, 음악극 작업은 서사가 있고 인물이 있다 보니 인간의 문제, 집단의 문제를 음악적으로 다룰 수가 있었다. 물론 기악 작업도 꾸준히 하면서 여러 상을 수상하기도 했지만, 이후의 작업은 극음악 작업에 더 애착을 갖게 된다. 이때 이후로 오페라, 뮤지컬, 음악극뿐만 아니라 연극이나 TV 드라마의 음악 등 다양한 극음악 작업을 이어갔다.
세상에 대해 발언하고픈 욕망이 많은 예술가는 결국 직접적인 발언의 출구를 찾게 된다. 음악극은 세상에 대한, 현실에 맞닿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통로였다. 그러나 음악극 작곡가는 작가가 이루어놓은 서사를 바탕으로 음악적 작업을 해야 한다. 아무래도 자신의 목소리로 발언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주어진 서사를 음악적으로 자기화하는 과정이 그 자체만으로도 매력적이에요. 이건 이것대로 매력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음악적인 상상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에 서사가 대응하는 방식도 경험해 보고 싶어진 거죠. 그런 욕심 때문에 대본 작업을 하기도 했어요. 이제는 더 나아가 음악을 상상하지 않고 대본을 완성하고 싶다는 단계에 이르게 된 거죠.”
서사무가극 <발푸르기스>에서도 대본, 연출, 음악을 맡는다. 이렇게 한 작업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무가극(巫歌劇)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판소리나 굿도 그렇고 서사를 음악적으로 전개하는 특징이 있어요. 판소리에서 사설의 언어나 서사가 음악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굿도 마찬가지예요. 무가에서 공수(아니리처럼 풀어내는 말)나 노래, 춤이 절대적으로 나눠진 게 아니거든요. 전통예술은 애초부터 이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노동요에서도 행위 자체와 노래, 가사를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하나였죠. 전통 음악극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음악극의 대본 작업은 희곡 작법이랑 다른 행위예요. 개인적으로는 대본 작업이 음악적 행위로 느껴져요.”

괴테와 굿이 만나고, 새로운 양식을 빚는 순간
<발푸르기스>의 장르는 ‘서사무가극’이다. 무가(巫歌)는 소위 ‘굿’을 의미한다. 서사무가극은 독특한 굿의 언어로 인물과 서사를 풀어내려는 연극적 시도이다. 황호준은 괴테의 <파우스트> 중 발푸르기스 장면을 만신의 언어로 풀어내는 작업에 대해 ‘서사무가극’이라고 명명했다. 생소한 시도이지만 굿이 지닌 연극성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법하다.“판소리가 3인칭이라면, 굿은 1인칭이에요. 굿은 3인칭으로 시작하지만 접신하는 순간 1인칭으로 변하거든요. 접신이 되는 순간부터 공간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다루는 방법이 훨씬 연극적이고 음악도 더 연극적으로 기능하게 되요. 서사무가극의 대본을 쓰는 과정은 기존 인물의 서사에서 만신의 문체를 찾아내는 거예요. 나아가 굿이라는 양식으로 서사를 풀어내야 해요.”
설명을 듣다 보면 서사무가극이라는 장르가 굉장히 매력적이면서도 동시대적인 장르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국립창극단의 창극이 그 틀을 넘어서는 순간 동시대성을 얻고 젊은 관객들에게도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처럼, 무가라는 낯선 장르도 그 틀을 확장하면서 동시대적인 예술로 거듭날 것 같았다. 서사무가극이란 장르를 실험하면서 그 서사의 시작을 괴테의 <파우스트>, 그중에서도 발푸르기스 장면을 선택한 것이 궁금했다.
“저는 굿을 하나의 연극 양식으로 보고 있어요. <파우스트>는 서구 문학의 정수이고 굿이라는 양식에 괴테의 서사가 얹힐 수 있다면 굿이 굉장히 다양한 서사를 담아낼 수 있는 연극적 틀이라는 거잖아요. 창극과는 또 다른 독특한 연극 양식으로 양식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파우스트>를 선택했어요. 주제적으로는 우리가 이룩한 문명이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과 회의에서 시작했어요. 메피스토펠레스가 파우스트에게 던지는 질문도 그렇고, 발푸르기스 장면이 인간의 욕망을 다루기에 적합한 소재라고 생각했어요.”
서구 문학의 대표작을 만신의 언어로 바꾸는 과정을 하고 있는 지금, 황호준은 매일 메피스토펠레스가 나타나 비웃고 가는 지옥을 대면하고 있다고 한다. 창작의 길은 늘 가시밭길이었지만, 특히 이번 작업은 작품을 창작하는 동시에, 양식을 만들어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욱 힘겹다.
모든 도전은 위험성을 담보한다. 위험성을 담보하지 않은 도전은 도전이 아니다. 담보된 위험성이 높다는 면에서 <발푸르기스-욕망의 기원>은 충분히 가치 있는 도전이다. 의미 있는 도전을 하는 <발푸르기스-욕망의 기원> 기대하고 응원한다. 더불어 서사무가극에 대한 도전이 이번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발푸르기스>는 물론 앞으로 제작되는 ‘서사무가극’의 실험은 꾸준히 찾아가 응원하고 지켜볼 것 같다.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새로운 양식의 탄생을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
글
박병성
월간 <더뮤지컬>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월간 <공연전산망> 편집장을 역임하고 한국일보 및 각종 매체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사이버대, 국제예술대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저서 <뮤지컬 탐독>이 있다.